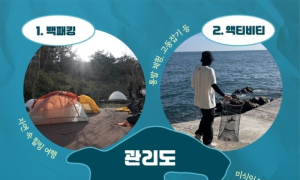
한강 철교를 건너는 동안
잔물결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왔다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빼서 서울을 떠난 후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한강,
어제의 내가 그 강물에 뒤척이고 있었다
한 뼘쯤 솟았다가 내려앉는 물결들,
서울에 사는 동안 내게 지분이 있었다면
저 물결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결, 일으켜
열 번이 넘게 이삿짐을 쌌고
물결, 일으켜
물새 같은 아이 둘을 업어 길렀다
사랑도 물결, 처럼
사소하게 일었다 스러지곤 했다
더는 걸을 수 없는 무릎을 일으켜 세운 것도
저 낮은 물결, 위에서였다
숱한 목숨들이 일렁이며 흘러가는 이 도시에서
뒤척이며, 뒤척이며, 그러나
같은 자리로 내려앉는 법이 없는
저 물결, 위에서 쌓았다 허문 날이 있었다
거대한 점묘화 같은 서울,
물결, 하나가 반짝이며 내게 말을 건넨다
저 물결을 일으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 나희덕, ‘저 물결 하나’ 전문

노을에 젖어 물결 철썩이는 한강 가양대교 아래서, 고등학교 친구와 만나 오징어에 캔맨주를 마시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후 지인의 요트를 타고 밤섬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향하며 노을 속에서 투덜대며 가는 지하철 풍경과 한강의 오버랩 속에서 나를 보았다. 나희덕 시인의 이 작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강의 섬을 찾아서’라는 책을 쓰면서 언론보도 속의 ‘한강’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한강’관련 보도 문장 중 가장 많은 키워드가 ‘자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는 ‘부동산’이었다.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한강 철교를 건너는 동안”, “잔물결”은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빼서 서울을 떠난 후”, “어제의 내가 그 강물에 뒤척이고 있었다” 이 두 문장으로 시인의 마음을 거의 반추할 수 있다.
“열 번이 넘게 이삿짐을 쌌고”, “아이 둘을 업어 길렀다” 그렇다. 시인은 1주일에 20시간 이상 강사를 전전하며 두 아이의 든든한 엄마 역할까지 해냈다.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빼서 서울을 떠난 후” 광주 조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했고, 다시 상경해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에 사는 동안 내게 지분이 있었다면/저 물결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충분하다. 도리어 시인 교수의 겸허하고 위대한 모성애 심성을 읽을 수 있다. “더는 걸을 수 없는 무릎을 일으켜 세운 것도/저 낮은 물결, 위”였고 이 풍진세상 “뒤척이며, 뒤척이며”, “저 물결, 위에서 쌓았다 허문 날” 그런 “서울, 물결”따라 흘러온 세월이었다.
한강은 시인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묵묵히 흐르는 삶이고 청사(靑史)이다. 그런 삶들이 점점이 모여 “거대한 점묘화 같은 서울”로 흐르고 그런 서울, 그런 한강을 지탱하고 되살리는 에너지도 우리 민초들의 끈끈한 삶이다. 그렇게 민초들은 “저 물결을 일으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글‧사진: 박상건(시인. 섬문화연구소 소장)






















